
|
THE YOOJUNG TIMESyoojungtimes.com |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고독의 두려움 때문에 자유로부터 이탈, 파시즘의 깃발 아래 |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
조선희 (소설가)
지난 1세기 동안의 정신사를 구축해온 두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일 것이다. 두 사람은 각각 사회구조와 개인심리에 대한 19세기적 사고방식에 ‘메스’ 정도가 아니라 ‘전기톱’을 들이댔다. 그렇게 해서 20세기의 지평에 계급혁명과 정신분석이라는 두 가지 테마가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앞의 것은 물질세계에, 뒤의 것은 정신세계에 관여했으니 두 가지는 차원도 영역도 완연히 달랐다. 심지어 서로 배척하는 경향마저 있다. 마르크스가 왼쪽이면 프로이트는 오른쪽이었다. 가령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른바 운동권서클에 열심인 학생들은 정신분석 운운하는 학생들을 나이브하며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했고 정신분석책 끼고 다니는 아이들은 데모하는 아이들을 천박하며 정치적이라고 우습게 보았다. 하지만 이 두 진영 사이에 판문점과도 같은 소통의 공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에리히 프롬이었다. 에리히 프롬은 양쪽 진영 모두에서 즐겨 읽혔다. 우리가 운동권서클에서 세미나의 필독서로 읽던 책들이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소유냐 삶이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같은 것들이었다.
사회학적인 정신분석학자, 또는 심리학적인 사회학자인 에리히 프롬(1900-1980)은 사상적으로 마르크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프로이트의 아들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사상을 동시에 계승해서 사회심리학의 아주 특별한 영역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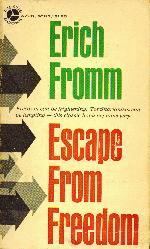
<소유냐 삶이냐>는 대학 신입생 시절, 외우기식 역사공부와 사지선다형 시험에 길들여진, 그야말로 내 자신의 생각이라고는 한 톨도 들어있지 않던 내 머리에 어떤 삶의 철학이라는 걸 집어넣어주었다. 거기서 나는 ‘소유’가 아닌 ‘삶’의 선택했던 것인데, 당시로서는, 강의 빼먹고 데모대 뒤꽁무니에 따라다니는 것으로 실천한 셈이다. <사랑의 기술>은 내게 ‘사랑은 관심’이라는 메시지 하나로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그런 문장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두 권의 책은 그야말로 20대 초반에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 사라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었다.
신문사를 그만둔 뒤에 나는 비로소 다시 편안하게 책 읽을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정독하게 되었는데, 소설도 아닌 책을 그렇게 흠씬 빨려 들어가서 읽은 예가 근래에 또 있었던가, 싶다. 나는 어떤 책을 읽다가 영 안 읽히고 이해가 잘 안가면 미련 없이 팽개친다. 그건 내 영혼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책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책을 읽을 때는, 그야말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뇌세포의 갈증이 시시각각 해소되는 느낌에 밥 생각조차 잊게 마련이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읽을 때는, 번잡하고 분주한 기자생활 19년 끝에 내 영혼이 거의 자갈밭처럼 황폐해져있던 무렵이었다.
이 책은 물론 ‘권위주의’에 대한 뛰어난 연구서이고, ‘왜 멀쩡한 독일사람들이 나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이지만, 내게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해명을 해주고 있었다.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사람과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다르며, 봉건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내 오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었다. 가령, 르네상스시대 이후에 사람들의 명예욕이 심해졌는데 그건 중세사회의 인간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근대 이후 신분계급이 없어지고 권력과 명예와 부가 모두 시장에 나오면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으며 그래서 열정과 불안이 서구 근대인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 첫 장편소설 ‘열정과 불안'도 이 책에서 뽑아낸 제목이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공포가 고독이라고 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 한층 자유로와졌지만 동시에 한층 고독해졌다. 또한 적의에 찬 세계 속에 홀로 던져진 사람들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로부터 도망쳐서 파시즘의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이다.
조선희 (소설가)
지난 1세기 동안의 정신사를 구축해온 두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일 것이다. 두 사람은 각각 사회구조와 개인심리에 대한 19세기적 사고방식에 ‘메스’ 정도가 아니라 ‘전기톱’을 들이댔다. 그렇게 해서 20세기의 지평에 계급혁명과 정신분석이라는 두 가지 테마가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앞의 것은 물질세계에, 뒤의 것은 정신세계에 관여했으니 두 가지는 차원도 영역도 완연히 달랐다. 심지어 서로 배척하는 경향마저 있다. 마르크스가 왼쪽이면 프로이트는 오른쪽이었다. 가령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른바 운동권서클에 열심인 학생들은 정신분석 운운하는 학생들을 나이브하며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했고 정신분석책 끼고 다니는 아이들은 데모하는 아이들을 천박하며 정치적이라고 우습게 보았다. 하지만 이 두 진영 사이에 판문점과도 같은 소통의 공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에리히 프롬이었다. 에리히 프롬은 양쪽 진영 모두에서 즐겨 읽혔다. 우리가 운동권서클에서 세미나의 필독서로 읽던 책들이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소유냐 삶이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같은 것들이었다.
사회학적인 정신분석학자, 또는 심리학적인 사회학자인 에리히 프롬(1900-1980)은 사상적으로 마르크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프로이트의 아들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사상을 동시에 계승해서 사회심리학의 아주 특별한 영역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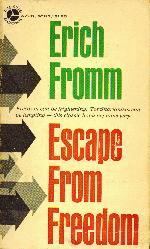
<소유냐 삶이냐>는 대학 신입생 시절, 외우기식 역사공부와 사지선다형 시험에 길들여진, 그야말로 내 자신의 생각이라고는 한 톨도 들어있지 않던 내 머리에 어떤 삶의 철학이라는 걸 집어넣어주었다. 거기서 나는 ‘소유’가 아닌 ‘삶’의 선택했던 것인데, 당시로서는, 강의 빼먹고 데모대 뒤꽁무니에 따라다니는 것으로 실천한 셈이다. <사랑의 기술>은 내게 ‘사랑은 관심’이라는 메시지 하나로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그런 문장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두 권의 책은 그야말로 20대 초반에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 사라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었다.
신문사를 그만둔 뒤에 나는 비로소 다시 편안하게 책 읽을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정독하게 되었는데, 소설도 아닌 책을 그렇게 흠씬 빨려 들어가서 읽은 예가 근래에 또 있었던가, 싶다. 나는 어떤 책을 읽다가 영 안 읽히고 이해가 잘 안가면 미련 없이 팽개친다. 그건 내 영혼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책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책을 읽을 때는, 그야말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뇌세포의 갈증이 시시각각 해소되는 느낌에 밥 생각조차 잊게 마련이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읽을 때는, 번잡하고 분주한 기자생활 19년 끝에 내 영혼이 거의 자갈밭처럼 황폐해져있던 무렵이었다.
이 책은 물론 ‘권위주의’에 대한 뛰어난 연구서이고, ‘왜 멀쩡한 독일사람들이 나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이지만, 내게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해명을 해주고 있었다.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사람과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다르며, 봉건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내 오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었다. 가령, 르네상스시대 이후에 사람들의 명예욕이 심해졌는데 그건 중세사회의 인간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근대 이후 신분계급이 없어지고 권력과 명예와 부가 모두 시장에 나오면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으며 그래서 열정과 불안이 서구 근대인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 첫 장편소설 ‘열정과 불안'도 이 책에서 뽑아낸 제목이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공포가 고독이라고 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 한층 자유로와졌지만 동시에 한층 고독해졌다. 또한 적의에 찬 세계 속에 홀로 던져진 사람들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로부터 도망쳐서 파시즘의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이다.




